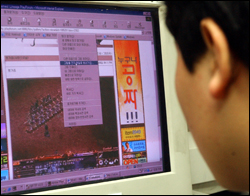청소년 온라인게임 중독 심각… 치료도 쉽지않아<br>"10명중 2명꼴 증상… 국가차원 예방책 필요" 지적에<br>게임업계선 "문화콘텐츠 과도한 규제" 부정적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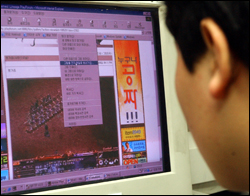 | | ▲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온라임게임 셧다운제도'와 일정 게임시간이 지난면 아이템 수익이 줄어드는 '피로도시스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
|
초등학교 4학년 남준수(가명)군은 인터넷게임에 빠져 밤낮을 가리지 않고 PC방에서 살다시피 한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PC방이 보이면 무작정 내려 게임을 하고 수업시간 중에도 빠져나가 게임을 하기 일쑤다. 남군의 부모는 게임 제한시간인 밤 10시가 되면 PC방의 전화를 받고 아이를 데리러 가곤 한다. 거리를 헤매다 경찰에 발견된 남군을 데리러 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실시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남군은 치료 후에도 PC방에 가기 위해 세 차례나 무작정 집을 나갔다. 어찌해야 할지….(자녀가 인터넷게임 중독에 빠진 부모가 인터넷중독예방센터에 올린 상담글을 재구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온라인게임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학생의 81%, 고등학생의 72%가 일주일에 1~2회 이상 온라인게임을 한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온라인게임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한 번 중독되면 마약중독처럼 치료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게임중독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가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피로도시스템, 셧다운제도 도입해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11일 주최한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들이 쏟아졌다.
유홍식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부터 중국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피로도 시스템’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로도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고 메시지와 함께 게임 수익을 감소시켜 과도한 사용을 막는 것이다. 게임을 한 지 3시간이 지나면 ‘인터넷 접속을 끊고 휴식을 취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캐릭터 업그레이드 등으로 얻는) 게임 수익이 50% 감소한다’는 문구가 30분마다 화면에 뜬다. 5시간이 지나면 15분마다 ‘접속을 끊지 않으면 신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문구가 뜨며 이 때부터는 게임 수익이 0으로 된다.
이현숙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상임대표는 “태국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온라임게임 셧다운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총량제로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여러 개의 ID를 사용해 게임을 바꾸어가며 할 수 있는 만큼 청소년 전용 원패스 ID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장희 놀이미디어센터 소장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게임 접속시간과 아이템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제안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게임업계 '문화콘텐츠 과도한 규제 안돼'=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승훈 한국게임협회 사무국장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는 필연적으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ㆍ일본ㆍ유럽 선진국들도 게임 공급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게임업체가 병원과 협약을 맺고 게임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국대병원은 지난 5월 온라인게임회사 예당온라인과 1년간 게임중독 청소년들을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지원받은 사례가 없다. 하지현 건국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는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제한하다 보니 실효성이 크지 않는 것 같다. 맞벌이 부부가 일하러 나간 뒤 어린이 혼자 병원을 찾기는 쉽지 않아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성과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며 “게임중독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신과 상담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