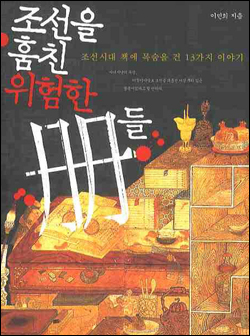■조선을 훔친 위험한 책들 ■이민희 지음, 글항아리 펴냄
1372년 고려 공민왕 때 만든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알려진 독일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주조 보다 63년이나 앞섰다는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두 금속활자본의 차이는 그러나 대중화에 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인쇄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됐으며, 지식의 보급확산에 막대한 영향을 준 데 반해, 우리의 인쇄술은 소수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다. 인쇄술과 사회변혁의 상관관계라는 차원에서 직지심체요절이 낮게 평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식에 대한 욕구는 커지지만, 글을 아는 무리가 늘어나 성리학 통치 기반이 흔들릴 것을 우려, 서사(書肆ㆍ지금의 서점)를 통한 책 유통을 막았던 때가 바로 조선시대다.
고전문학 전문가인 이민희 아주대 교수는 조선시대에 발간됐으나, 유교를 반대하는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려 빛을 보지 못한 책을 통해 조선시대 다양했던 사유의 흔적을 찾아낸다.
1508년경 등장한 최초의 한글소설 ‘설공찬전(薛公瓚傳)’은 불교윤회사상과 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수거돼 불태워졌으며 이를 쓴 채수(蔡壽ㆍ1449~1515)는 파직당했다. 유학자들이 성리학 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양명학을 비판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여온 책 ‘곤지기’ ‘이단변정’ ‘학부통변’ 등이 국내에 퍼지면서, 되래 양명학을 공부하는 재야세력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책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소현세자가 8년간 청나라 심양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심양장계(瀋陽狀啓)’ 는 친명배금을 명분으로 집권한 서인세력을 위험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갑작스러운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됐다는 것.
저자는 기독교가 지배한 서양의 중세가 암흑기로 묘사되듯 500년 조선사도 상상력이 억압된 통제사회로 규정한다. “시대와의 진정한 의사소통은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 될 수밖에 없는 지 이 책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우리 시대의 결을 거스를 수 있는 지식의 생산이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